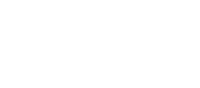이런 억울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했더니 B씨가 "나도 너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상계하자"고 했습니다. A씨는 "사기를 당해서 빌려준 돈인데 상계는 말도 안 된다"며 법정까지 갔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건의 전말
원고 A씨가 피고 B씨의 기망행위(속임수)에 속아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전형적인 사기 상황이었죠.
A씨가 B씨에게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연한 권리 행사였죠.
그런데 B씨가 "나도 A씨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상계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사기를 친 주제에 뻔뻔하게 상계를 주장한 것입니다.
A씨는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니까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어 상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타당한 주장이었죠.
하급심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법리 해석이 복잡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8월 1일, 드디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A씨에게 불리했습니다.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상 채권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496조가 뭐길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상계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차를 고의로 박아놓고 "나도 너한테 받을 돈 있으니 상계하자"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상계(相計)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등액에서 서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B도 A에게 8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80만원은 서로 상계되고 A가 B에게 20만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
"계약상 채권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아니라 쌍방 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다.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는 성질이 다르다"
즉, A씨가 만약 "사기를 당했으니 손해배상을 달라"고 불법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민법 제496조가 적용되어 상계가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계약대로 대여금을 달라"고 계약상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상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까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이 경합하는 경우 - 하나의 원인으로 두 개의 청구권이 발생
- 실질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 - 상계 금지의 취지에 부합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순수하게 계약상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실무상 영향과 대응방안
• 사기 피해자의 불리: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줘도 상계를 막을 수 없음
• 채무자에게 유리: 사기를 쳐도 상계 권리는 그대로 보장
• 법리의 엄격성: 계약상 권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명확히 구분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응법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계약상 권리 대신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계약 취소 주장 -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 자체를 취소
-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의 반환 요구
- 형사고발 병행 - 사기죄로 고발하여 압박 효과 도모
- 가압류 등 보전처분 - 상대방 재산 은닉 방지
유사한 실제 사례들
• 대법원 2017. 2. 15. 선고 사건: 고의의 불법행위가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상계 금지 인정
• 대법원 2002. 1. 25. 선고 사건: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이 경합하는 경우 상계 금지 적용
• 서울중앙지법 2023년 사건: 투자사기 피해자가 계약상 권리를 주장한 경우 상계 허용
일상생활 속 주의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나중에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권리 주장: 상계 허용 → 받을 돈이 줄어들 위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상계 금지 → 전액 받을 가능성 높음
주의: 한 번 선택하면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전문가들의 평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사기 피해자에게는 가혹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구분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받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망행위에 대해 청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억하세요! 사기를 당했다면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사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의 성격에 따라 보호받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