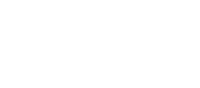51세 일용근로자 A씨의 사연입니다. 2014년 7월, 크레인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왼쪽 골반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계산 과정에서 월 가동일수가 쟁점이 되었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20여 년 만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 A씨(51세)가 크레인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 중 안전망이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장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9년 2월까지 총 3억 5천만원(휴업급여 2억 900만원 + 요양급여 1억 1천만원 + 장해급여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의 보험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월 가동일수 19일로 인정
2심: 월 가동일수 22일로 인정 (기존 관례 적용)
보험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왜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을까
대법원이 22년간 유지해온 기준을 바꾼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제 정착: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 40시간 단축
- 공휴일 증가: 대체공휴일 신설,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
- 일과 삶의 균형: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정책 확산
- 통계 자료 변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 큰 변화
가동일수 변화 비교
| 구분 | 과거 기준 (1992~2024) | 현재 기준 (2024~) | 변화율 |
|---|---|---|---|
| 월 가동일수 | 22일 | 20일 이하 | -9.1% |
| 연 가동일수 | 264일 | 240일 이하 | -24일 |
| 주 근로시간 | 44시간 | 40시간 | -4시간 |
실제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 일당: 15만원 (2014년 기준 도시일용노임)
• 가동 기간: 만 65세까지 약 14년
• 기존 방식 (월 22일): 15만원 × 22일 × 12개월 × 14년 = 약 5억 5천만원
• 새로운 방식 (월 20일): 15만원 × 20일 × 12개월 × 14년 = 약 5억원
차이: 약 5천만원 감소 (현가 기준 약 3천만원)
대법원 판례의 변천사
1992년 대법원 판결: "육체노동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
2001년 대법원 판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2024년 대법원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무려 32년에 걸쳐 25일 → 22일 → 20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로환경이 그만큼 개선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
- 산재 피해자: 휴업급여, 장해급여 산정시 적용
- 교통사고 피해자: 일용근로자 일실수입 계산시 적용
- 보험회사: 손해사정 기준 변경 필요
- 변호사/법무팀: 손해배상 청구시 새로운 기준 적용
앞으로 주의할 점
• 개별 사정 검토: 20일은 일반적 기준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음
• 직종별 차이: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에 따른 세부 검토 필요
• 통계 자료 활용: 고용노동부 통계 등 객관적 자료 중요
• 지역별 차이: 도시와 농촌 지역의 근로여건 차이 고려
유사한 최근 판례들
- 2022다12345: 건설 일용근로자 월 19일 인정 (지역 특성 반영)
- 2023다67890: 조선업 일용근로자 월 18일 인정 (업종 특성 반영)
- 2023다11111: 농업 일용근로자 월 15일 인정 (계절성 고려)
- 2024다22222: IT 프리랜서 월 22일 인정 (전문직 특성)
기억하세요! 이번 판례는 단순히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산재나 교통사고 보상에서 이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